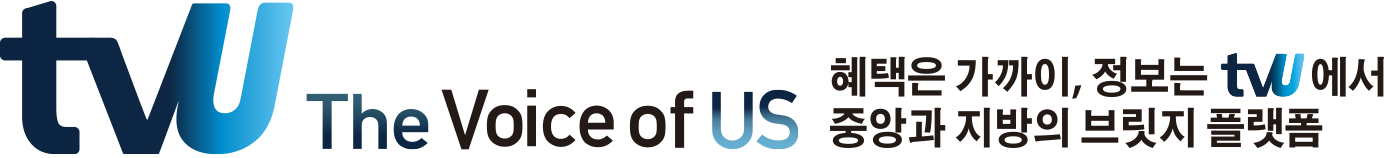혁신(革新, Innovation)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뜻한다. 기능이 제한된 피처폰 위주의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불렀다. 즉혁신은 그것을 기점으로 세상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만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닌데 ‘혁신’이 라고 부른다면, 그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에서 추진했던 지방 균형 발전 계획도시 사업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기관 주변에 계획도시를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던 상황이라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혁신’으로 일컬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2008 년 금융위기가 터진 데 이어 중앙 정부기관들도 위치 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이 ‘혁신’의 아이콘은 추동력을 잃고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더구나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진 상황. 도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간 지방자치》는 해외의 ‘도시 혁신’에 눈을 돌려봤다. 해외 선진국들은 무엇을 ‘도시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것들을 진정한 도시 혁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4년부터 유럽의 ‘iCapital’ 을 선정하고 있다. 혁신 수도(Capital of Innovation)의 준말인 iCapital로 EU는 올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선정했다.
그들은 무엇을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2016년 유럽연합이 선정한 유럽의 iCapital 암스테르담을 비롯 토리노, 파리 등 유럽의 대표적인 혁신 도시 들이 이루고 있는 도시 혁신사례에 대해 조사해봤다. 또한 유럽 연합 외에 혁신 사례로 새롭게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함께 소개했다. 그리고 도시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실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된 사례들이 모두 강력하고 엄청난 혁신 사례라고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혁신도시’ 프레임과는 다르게 도시 혁신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혁신’이라고 불렸던 것은 사실 이제 혁신이 아닐 수도 있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기획이, 전국 최일선에서 지방 혁신을 위해 고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남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