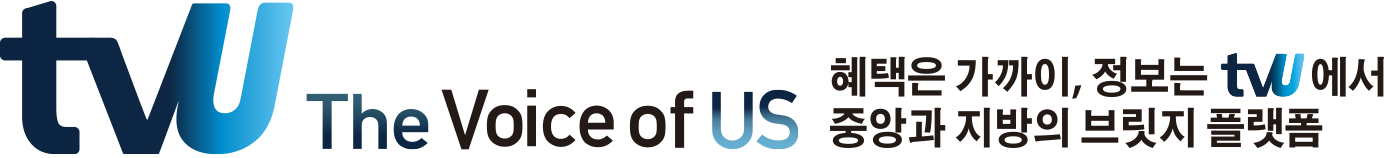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본격 제도화 된 것은 미국이 헌법(1조 6항 1호)에 면책 특권을 명시한 이후부터다. 해외 각국에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일본 예외 규정 둔 덕분에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없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면책특권이 운영된다. 일본 헌법 52조는 중의원이나 참의원이 국회에서 한 연설, 토론, 표결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에 중의원이나 참의원에서 무례한 발언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을 당한 의원은 이에 대해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의원은 40명 이상, 참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징벌안을 제출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고, 사죄, 등원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일본 헌법 51조에 중의원이나 참의원의 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참의원 또는 중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는 불체포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원외에서의 현행범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도 국회 밖에서는 현행범인 경우 체포할 수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1948년 이후 1954년과 1958년 두 번을 제외하고는 의원에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기초의원도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독일 그러나 비방과 모욕에는 적용 안 돼
독일기본법 제46조 제1항은 연방 의회 의원은 연방의회(Bundestag)와 그 위원회(Aussch sse)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표결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를 갖지만 비방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의 기본법에 따라 연방의회 의원,연방의회 의장단의 구성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방대통령선거법에 따라서연방총회(Bundesversammlung)의 구성원과 연방공화국에 속하는 주의회 의원, 주헌법에 따라 각 주 의회의 의원들에게도 면책특권이 보장된다.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기본법상의 규정과 대체로 유사하게 보장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활동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temberg) 주헌법 제37조는 주의회와 그 위원회, 교섭단체에서의 발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의원의 직위에서 행하는 발언을 모두 면책특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바이에른(Bavern)주의 경우 주법률에 따라 시·군·구 기초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도 면책특권이 보장되며, 주헌법 제27조에 따라 의원의 면책특권을 ‘표결’로 제한하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 정한 특권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만 면책권이 있는 프랑스
프랑스는 18세기 말 시민혁명 당시 삼부회(프랑스 구제도의 신분제 의회)가 “현 회기 중 또는 이후에 삼부회(…)에서 행한 제안, 의견, 견해 또는 발언을 이유로 의원을 소추, 수사, 체포 또는 체포토록 하거나 구금 또는 구금토록 하는 개인·법원 또는 위원회는 국민을 경멸하고 반역하는 자이며 중대한 범죄자이다”라고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의원에 대한 특권을 만들었다. 이후 1791 제정된 헌법에 이를 명문화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행 프랑스 헌법 제26조 제1항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의 면책특권은 의원으로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대상을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즉 직무수행에 연계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직무수행과 구별 내지는 분리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원이 개인(私人)으로서 한 행위(대중 집회에서의 연설, 텔레비전 방송, 언론 기고와 같은 외부활동), 보좌관과의 고용계약 파기 등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적용된다.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임시 임무 수행에 관한 의견이나 보고서는 직무수행과 구별 또는 분리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며 면책대상인 발언과 표결을 외부에서 공표 또는 출판한 경우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