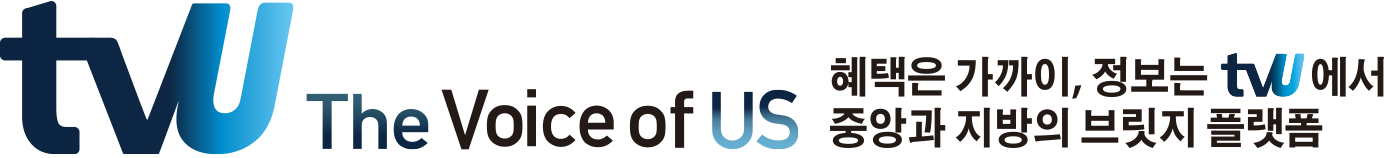봄철 불청객 미세먼지로 온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잘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봄꽃으로 아름답게 물 들어야 할 주변이 온통 회색빛이다. 한 낮에도 밤을 연상시키는 대기.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하늘을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온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는 날에는 아이를 등원시킬지 말지를 고민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심지어 봄꽃 축제 현장에도 마스크족(族)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수십 년 째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복잡한 인생살이에 비유 한다.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부터 복잡함 그 자체다. 계절과 발생 지역, 날씨에 따라 다르고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흙먼지에서 발생하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콕 집어 고를 수 없다. 흙먼지와 소금, 꽃가루처럼 자연발생부터 보일러나 발전시설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날림먼지, 소각장 연기 등 너무나 많다.
그런데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중국을 ‘의심’한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 선진국들은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질 악화로 고민하는 이들은 그 대응 방법이 엄격한 편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초과됐을 때 관할행정청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거나(독일), 노후 차량에 환경부담금을 높여 부과한다(영국).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원전 사고를 계기로 친환경 제조 공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생산품 수명을 엄격히 관리하기도 한다(일본).
우리는 어떤가? 2017년 미세먼지대책 특별법이 발의됐고 국회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입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을 꾸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과제로 놓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제 시작이다. 정확한 측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교육과 함께 국민들이 의견과 생각을 펼치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