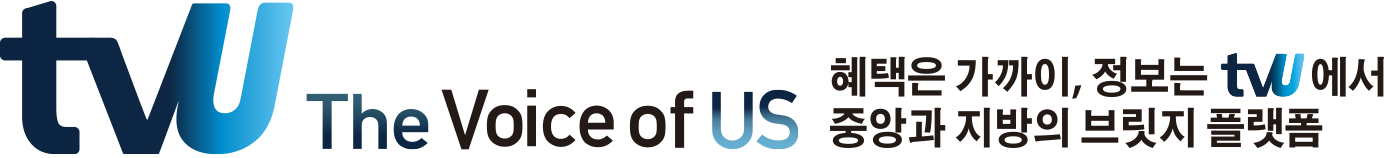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인류의 우주개발 시초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0년대 냉전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점인 1940년부터 두 강대국은 대륙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기술을 기반으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로켓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당시 두 나라의 대륙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은 서로의 핵무기개발을 부추길 여지가 컸기 때문에 공개적인 미사일 기술 연구는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고 여겼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기술 및 인공위성 기술의 실현은 그 나라의 기술적 위대함과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에 과학적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목표로 발사체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Space Race’라고 부른다. Race라는 말처럼 이는 곧 ‘경쟁’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은 누가, 어떻게 상대방보다 더 우수한 기술로 대기권을 벗어나 더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상당 기간 소련이 우위를 점했다. 1951년 소련은 인류의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시켰고, 1957년에는 ‘라이카’라는 강아지를 우주로 보내 생명체의 첫 우주비행을 가능케 했다. 또 1961년 유리 가가린의 첫 유인 우주 비행을 실현하는 등 소련은 Space Race의 모든 측면에서 앞서고 있었다. 미국도 우주비행에는 성공했지만 매번 소련보다 뒤쳐졌다. 이처럼 소련의 지속적인 Space Race 승리는 미국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세계의 시선 또한 소련의 기술적 우세함을 인정하며 미국 패배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960년대 소련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우주개발이 늦춰진 반면, 1969년 미국은 인류 첫 달 착륙을 성공시킴으로써 사실상 Space Race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Space Race에 승리한 미국 또한 내부적인 이유와 베트남전쟁 같은 대외적인 사건들로 인해 우주개발은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로 인해 우주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의 약 5%에서 0.5%로 축소되었고, 우주개발을 국가의 필요 요소(Mandatory)보다 재량적(Discretionary) 요소로 분류하며 “우주개발을 어떻게 더 할까?” 보다 “우주개발을 어떻게 지속할까?”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제한된 자원의 환경에서 온전히 경쟁을 시초로 한 우주기술의 개발은 시간이 지나자 점차 협력의 장으로 변했다. 냉전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의 대외교류가 많지 않았던 1970년대에도 두 나라의 우주개발자들은 과학이라는 중립적인 기반하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1970년 미국은 소련의 우주개발자들을 초대하여 미국 Apollo 우주선과 소련Soyuz 우주선을 연결(Docking)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였고, 1975년 Apollo-Soyuz 협력 우주비행을 성공시켰다. 이 협력은 ‘US-USSR Joint Working Group’이라는 과학 컨퍼런스의 시초가 되었고, 현재까지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두 나라는 우주개발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두 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의 우주개발자들에게 협력을 통한 비용절감 및 시너지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의 리더들은 인류공통의 목적과, 과학의 교류를 통해 대외관계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주개발협력을 외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미국 NASA의 우주개발자들이 우주정거장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미국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일본과 유럽국가를 초대하며 ‘미국우주정거장’ 개발은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Station–ISS)’ 개발
로 바뀐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비용인상과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신뢰를 잃고 1990년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프로젝트 취소까지 고려한다.
그러나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한 백악관의 최측근들은 우주강대국인 러시아를 개발에 초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당시 국제우주정거장개발을 함께 하고 있는 나라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미국은 러시아를 합류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개발촉진 및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결과 ISS는 1998년에 처음 준공을 시작하여 2011년 15개 국가의 협력으로 13년에 걸쳐 완공된다.
인류사상 최고 스케일의 인공물체(Man-made Object)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시킨 이후 인류의 우주개발은 더 이상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과 교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와 미국의 발사체 개발 협력, 일본과 미국의 글로벌 강수량 측정(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 협력, 호주의 위성지상국 개발, 캐나다의 로봇 팔(Robotic Arm), 미국과 소련의 유인우주선 협력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인공위성과 발사체, 첫 우주비행사도 다른 국가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력의 트렌드 속에 국가의 우주 리더십이라는 개념도 바뀌게 되었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우주정책연구소의 스콧 페이스(Scott N. Pace) 교수 및 정책소장은 “60년대에는 어느 나라가 먼저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하느냐가 우주개발의 리더를 정의하였다면 21세기 현재는 얼마나 많은 국가를 같은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가 우주리더십을 정의한다”고 말한다. 막대한 자원과 비용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필요 요소로 하는 우주 개발과 인류의 우주탐사는 한 국가가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 다가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극한 경쟁 속에 이루어지던 우주개발도 인류는 여러 국가 또는 인종의 경쟁이나 싸움이 아닌, 한 집단 사회(Collective Society)에서 함께 일궈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자체의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만의 강점을 찾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우주개발협력의 키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