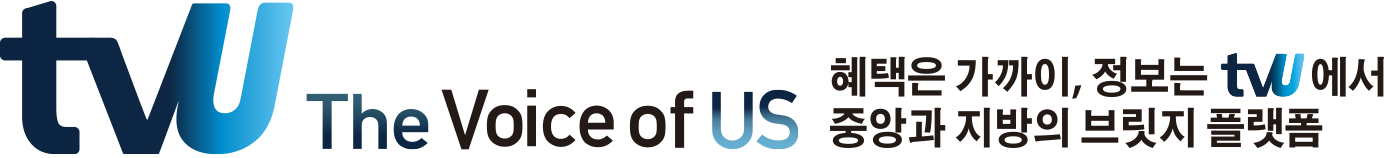행정안전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160억 원 들여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위원(서울 송파구 갑, 국민의힘)이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 내놓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과거 과기부에서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비교해 공신력, 범용성 측면에서 더 나은 점이 없고 예산만 잡아 먹는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짚었다.
김웅 위원이 국감 현장에서 시연한 영상을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명의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 후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삽입해 전원을 다시 켜도 유심칩을 제거했던 명의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대로 나타났다.
김웅 위원은 "행안부에서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서만 된다고 광고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도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차 렌트나 술도 사 마실 수 있다"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로 과기부에서 만들었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단말기 고유값과 유심칩 일련 번호를 통해 이 두 가지가 일치 하는지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만약 유심칩을 교체하면 해당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김웅 위원은 "단말기와 유심칩만 바꿔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용이 가능한데, 이게 무슨 모바일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조선 시대 호패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은 "행안부에선 범용성을 광고했지만, 이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범용성도 없다. 왜냐면 행안부가 법령으로 모바일 운전 면허증만 인정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행안부가 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본인 확인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웅 위원은 "이런 플랫폼이 아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일종에 네트워크여야 하는데, 이는 플랫폼이라기 보다 구시대적인 관료주의의 구제로 보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