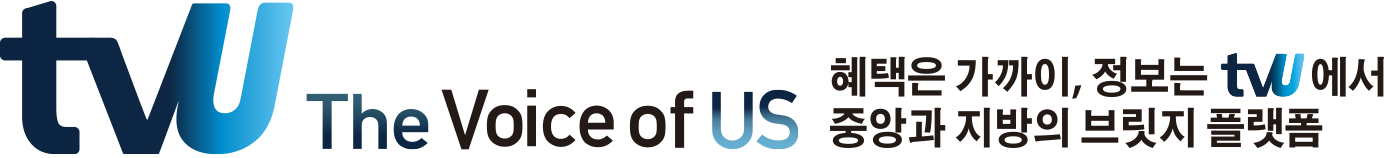최근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는 책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저자가 써내려간 《대통령의 글쓰기》다. 대통령의 말과 글은 왜 특별한가, 말과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혼란과 불통의 시대. 두 대통령에게서 배워보자.
기획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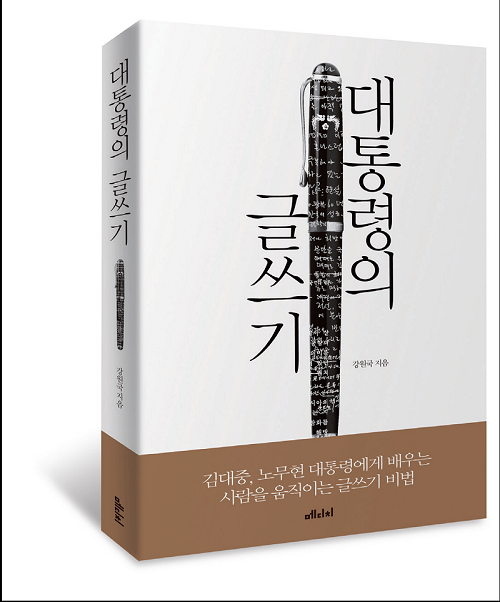
리더의 ‘말과 글’이 아쉬운 시대,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할 조건
야구선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공을 칠 수 없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도 딱 하나다. 욕심 때문이다. 잘 쓰려는 욕심이 글쓰기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문필가였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욕심을 안부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글에 관한 한 욕심이 대단했다. 두분 모두 ‘이 정도면 됐다’가 없었다.
두 대통령은 리더란 응당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문이 올라오면 수정액을 써서라도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로 수정했고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녹음테이프에 연설문을 녹음해서 연설비서실로 내려 보냈을 정도로 글에 관해서라면 늘 엄격했다.
김 대통령은 “리더는 글을 자기가 써야 한다. 자기의 생각을 써야 한다. 글은 역사에 남는다. 다른 사람이 쓴연설문을 낭독하고, 미사여구를 모아 만든 연설문을 자기 것인 양 역사에 남기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글쓰기’를 리더의 조건으로 꼽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광복절 경축사의 경우 노 대통령은 연초부터구상을 시작해 독회만 7~8차례, 버전도 서너 개나 만들었다. 연설문은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퇴고를 거듭해서 만들어졌다.
앞서 욕심이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글에 관한 대통령들의 욕심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떻게 쓰느냐’와 ‘무엇을 쓰느냐’의 차이다. (중략) 대통령의 욕심은 바로 무엇을 쓸 것인가의 고민이다. 그것이 곧 국민에게 밝히는 자신의 생각이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2003년 3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이 4월에 있을 임시국회 국정연설문 준비를 위해 담당자를 찾았다. 노 대통령은 늘 ‘직접 쓸 사람’을 보자고 했다. “앞으로 자네와 연설문작업을 해야 한다 이거지? 당신 고생 좀 하겠네.연설문에 관한 한 내가 눈이 좀 높거든.” 식사까지 하면서 두 시간 가까이 ‘연설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연설문 관련 회의 도중에 간간히 글쓰기에 관한 지침을 줬다.
•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해주게. 헷갈리네.
• 굳이 다 말하려고 할 필요 없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연설문이 될 수 있네.
•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써주게. 탁탁 치고 가야 힘이 있네.
•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머리에 콕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 글은 자연스러운 게 좋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지침 中>
“상대방이 내 말을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글쓰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니 무조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 좋다.”
김대중 대통령의 충고다. 그의 ‘대통령 수칙’ 7번이 ‘국민이 이해를 못 할 때는 설명 방식을 재고하자’다.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그를 탓하지 말고, 내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어렵게 말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글쓰기는 나와 남을 연결하는 일이다. 그 글을 봐주는 사람이 이해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알아듣게 하고 제대로 이해시킬 책임은 쓰는 사람에게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당연히 쉬운 말로 써야 한다. 전문용어로 ‘돼먹지 않은 알은체’는 자제해야 한다. 둘째, 명확하게 짚어줘야 한다. ‘내가 하려는 얘기의 요점은 이것, 이것, 이것이다’ 라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척 보면 알 수 있어야한다. 셋째, 사례를 들고 비유한다. 넷째, 반복해줘야 한다.
왕관을 쓰려는 자, 글을 써라
존 F. 케네디의 조언자이자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리처드 뉴스태트(Richard Newstadt)는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힘에 있다고 했다. 설득력이란 무엇인가? 바로 말과 글이다. 글 한 줄에 리더가 가진 정보와 생각과 지향을 다 함축해 낼 수 있다. 또 진심이 담긴 리더의 말 한마디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조직이나 국가의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늘 강조했다. “지도자는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쉽고 간결하게 말하고 글로 쓸 줄 알아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소 같은 생각을 얘기했다.“지금의 리더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정경유착의 시대도 막을내렸고, 권력기관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권력과 돈으로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말과 글, 그리고 도덕적 권위뿐이다.”
민주주의는 말이고 글이다. 말과 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민주주의 시대 리더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리더는 자기 글을 자기가 쓸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