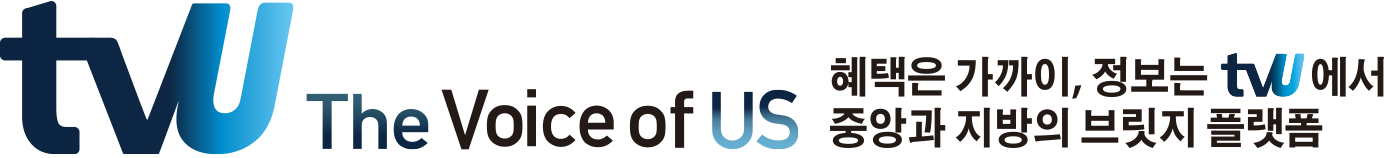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꿀 수 없었던 꿈을 해외에서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다.
기획 정우진 기자
“부모님 세대는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세대에서 봤을 때는 중산층이라는 게 일을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나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거나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도 40살이 넘어 명퇴한 후 치킨집을 차려야 하는 ‘꿈을 꿀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기를 쓰고라도 해외에 나가려고 한다. 다큐 ‘청년 탈출 꿈을 찾아서’를 따라 대한민국을 등지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따라가 봤다.
호주에서 수십 군데 매장에 이력서를 넣고 떨어져도
“아뇨. 한국에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양승호(24) 씨는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호텔 리셉셔니스트, 학원 수강생 매니저, 고층빌딩 보안요원 등을 전전해 모은 240만 원으로 호주 퍼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며 호주에서 돈을 모은 뒤 대학에 진학해 영주권을 따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승호 씨는 돌아오는 티켓을 끊지 않았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대한민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 씨는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그 일자리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치이고 치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았다”라고 답했다.
양 씨는 호주에 입국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수십 군데의 매장에 이력서를 넣고 거절당하는 일을 반복해서 당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 씨는 단호하다. “아뇨. 안들어요. 저는 여기 오래 있을 생각으로 왔거든요.”
한국에선 고되게 알바해도 생활비가 빠듯해 대학 포기한 청년.
호주에서 다시 ‘꿈을 꾸다’
호주 캘굴리에 거주 중인 이자룡(23) 씨는 변두리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한다. 아침에는 체크아웃된 객실을 청소하고, 저녁에는 호텔 숙소 레스토랑에서 접시닦이로 일한다는 이 씨는 한국의 어엿한 국립대학에서 취업 잘된다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이 씨는 한국에서도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 탓에 20살때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며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몸이 힘들어도 번 돈으로 생활이 충당될 수 있다면 괜찮은데 2012년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며 당시 최저임금인 4580원에 못 미치는 4200원을 받고 일을 했었다”는 이 씨는 “고단하게 하루 종일 일해 몸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고, 지나치게 적은 급여로 저축도 할 수 없는 한국생활은 좀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마트에서 물건을 하루 10시간 고되게 날라봐야 세금떼고 떨어지는 돈은 일당 4만 원가량. 결국 다니던 대학을 자퇴한 이 씨도 호주에서 돈을 모아 다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씨는 “훨씬 급여가 높은 호주에서 돈을 모아 경영학을 전공한 다음 싱가포르나 홍콩에 가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한다”며 한국에서는 꿀 수 없었던 ‘꿈’을 말했다. 이 씨는 한국에서 신문배달, 마트배달, 편의점, 놀이동산 아르바이트를 하며 3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던 300만 원가량의 돈을 호주에서 3개월 만에 모았다.
“한국에선 내가 노력을 안 했다는데 여기선 다들 인정해줘요”
일본 오사카 시내의 유명 대게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종현(27) 씨는 현재를 “제2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 씨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거의 못 넘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자기 여유시간을 다 가지면서도 아르바이트만으로 한 달에 18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행복해 한다.
박 씨가 한국을 떠나 온 건 취업 때문이었다.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썼지만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박 씨. 대기업, 중소기업, 대외활동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박 씨는 한 택배회사에 명절 배송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경험을 충격적이라며 말해준다. “우연히 옆 사람 이력서를 봤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택배 회사 알바를 구하는데 왜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런 알바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 씨는 면접 때 입으라고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양복을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입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 박 씨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원서만 넣으면 다 연락해 주고 모두들 제 능력을 인정해주니까 더 좋은 회사에 계속 지원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과연 한국에서 이들은 노력을 안 해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좌절했던 것일까.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를 말하고, 내로라하는 국립대와 좋은 전공을 가지고, 취업 ‘충분 스펙’이라는 800~900점대의 토익 등 외국어점수를 보유한 이들이기에,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이 리포트가 더 씁쓸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은 과연 이 같은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공직자라면, 이 다큐를 보고 청년들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