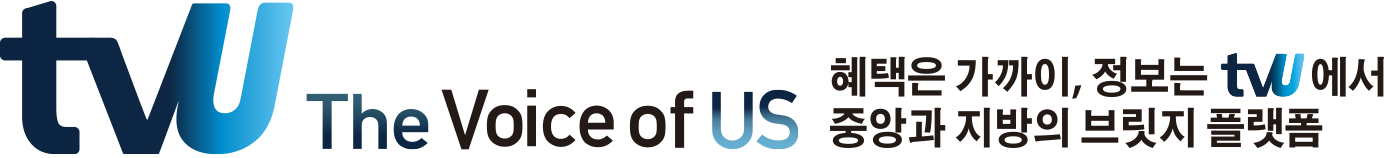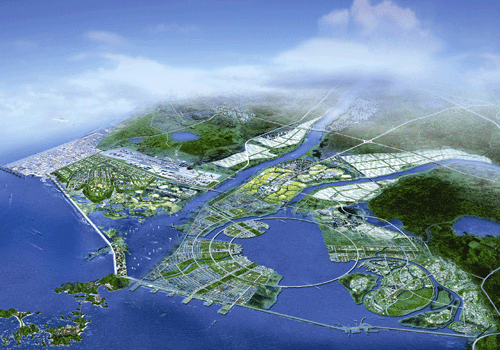Q. 질의
○○군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리(里)’명의로 돼 있는 미등기토지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마을회 소유의 토지라며 『부동산 소유 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 시행기간 2020. 8. 5.~2022. 8. 4. 2년)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를 신청, 그후 2개월간의 게시공고를 거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해당 토지는 구 임야대장에서 1968년에도 소유자복구가 됐고 1975년에 구획정리시행 신고됐으며,
1979년에 당시 시행하던 구 지적법 부칙에 따라 지목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는 마을회 소유라 보기 어려운바 오히려 ○○군 소유의 토지로 보여 ○○군 명의 등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의견 제시
1.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里) 마을회 총유재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상으로 ○○군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됐을 때 ‘동’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 소유지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면서 그 재산은 동 구성원의 총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소속 군에 귀속됐다 할 것(대법원 1966. 5. 10 선 고 66다176 판결참조)이라고 판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읍’, ‘○○면’, ‘○○동’으로 등재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속 지자체의 소유라는 취지입니다.
2. 그러나 ‘○○리’ 재산의 경우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동·리’ 재산은 총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대법원도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리(洞 ·里) 명의로 사정됐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 다60871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리’는 행정구역 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리’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 173 판결 참조),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됐다고 하여 마을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또한 ‘○○리’명의로 사정됐을 경우 그렇다면 위 ‘○○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면 해당마을의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리가 상위 행정기관인 피고의 소속기관이 됐다고 하여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피고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다(청주지방법원 2014. 4. 4 선 고 2012가단14326 판결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판결 취지에 비추어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바 ‘○○리’ 재산은 비법인사단인 해당 리 마을회 총유 재산이라는 점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신청하고 2개월 공고 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 재산은 과거 대법원 66다176판결에서 지자체 소유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가 대법원 95다32051판결 이후에는 ‘○○동’ 재산 역시 마을회 총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