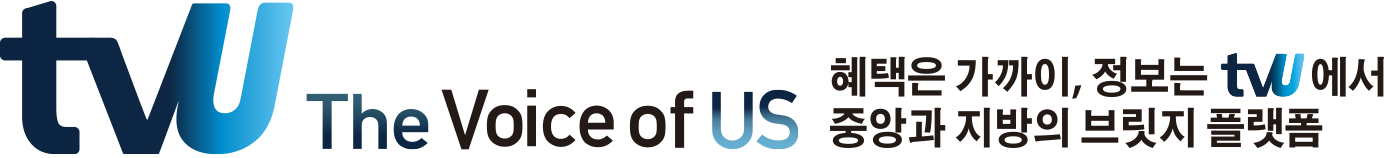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 갈등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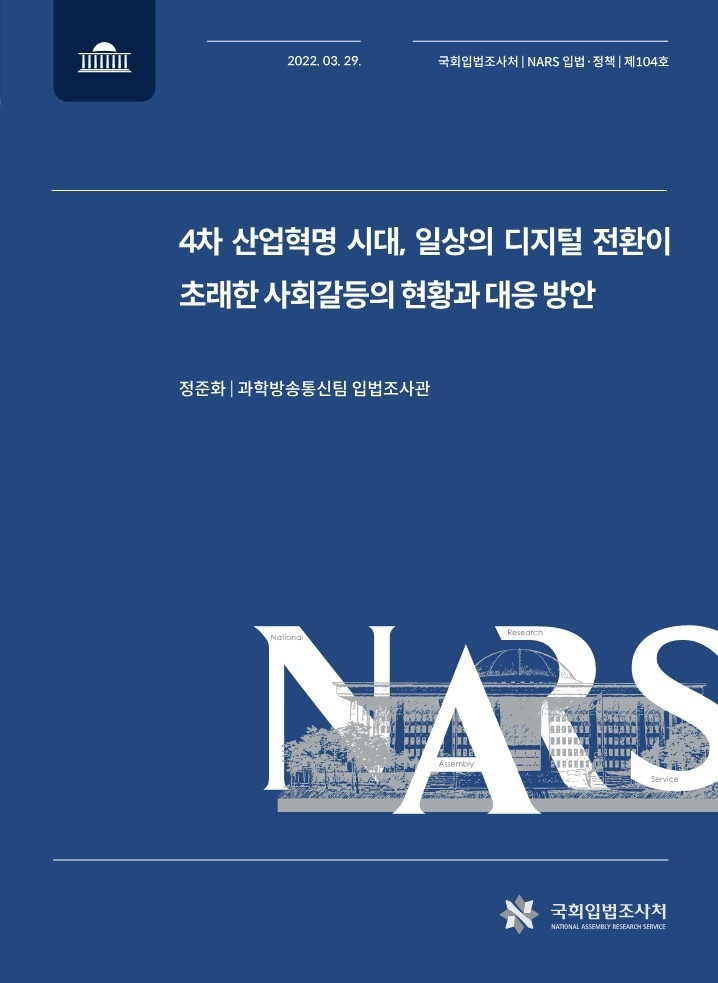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016년 제46회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됐고, 생산의 디지털 전환을 4차 산업혁명의 전형으로 보았다.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화상 회의앱을 이용해 재택 근무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구독하거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게 대표적이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촉진되었다.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사회 및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한다.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병의 위험도 크게 낮췄다.
반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사회 갈등도 촉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지만, 제도와 사회 규범이 이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와 택시 사업자 간의 갈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갈등,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갈등, 댓글을 두고 입점 업체와 이용자 간의 갈등, 메타버스 안에서의 성희롱, 스토킹과 같은 이용자 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지체되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과호 실현되고,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의 편익을 고루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4차 산업 혁명 정책 수립 시 사회갈등의 예측하고 분석하며 대응을 필수 요소로 반영하는 가칭 사회갈등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둘째, 사회 갈등 문제를 접수‧처리하는 독립된 단일 창구로 (가칭)디지털사회갈등 옴부즈만 신설을 검토할 것도 보고서에 담았다.
셋째,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사회 갈등은 시장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입법 규제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전입법영향분석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